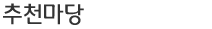|
받아쓰다
어머니는 글자를 모른다. 글자를 모르는 어머니는 자연이 하는 말을 받아 땅 위에 적었다. 봄비가 오면 참깨 모종을 들고 밭으로 달려갔고, 가을 햇살이 좋으면 돌담에 호박쪼가리를 널어두었다가 점심때 와서 다시 뒤집어 널었다. 아침에 비가 오면 "아침 비 맞고는 서울도 간다"고 비옷을 챙기지 않았고 "야야, 빗낯 들었다"며 비의 얼굴을 미리 보고 장독을 덮고 들에 나갔다. 평생 바다를 보지 못했어도 아침저녁 못자리에 뜨는 볍씨를 보고 조금과 사리를 알았다. 감잎에 떨어지는 소낙비, 밤에 우는 소쩍새, 새벽하늘 구석의 조각달, 달무리 속에 갇힌 보름달, 하얗게 뒤집어지는 참나무 잎, 서산머리의 샛별이 글자였다. 난관에 처할 때마다 어머니는 살다가보면 무슨 수가 난다고 했다. 세상에는 내가 가보지 못한 수가 얼마나 많은가. 마을에서 일어나는 일이 남의 일 같지 않다고 했다. 사람이 그러면 못쓴다고 했다. 어머니는 해와 달이, 별과 바람이 시키는 일을 알고 그것들이 하는 말을 땅에 받아적으며 있는 힘을 다하여 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