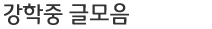친구들과 섬진강을 자전거로 달렸다. 150km, 짧지 않은 거리를 1박 2일 코스로 다녀왔다. 서울에서 싣고 온 자전거를 임실의 전북 강진 공용버스 터미널에서 내려 장군목, 향가 유원지를 거쳐 곡성에서 하룻밤을 묵었다. 다시 곡성을 출발하여 황탄정~사성암~하동 화개장터~광양 매화마을~배알도 수변공원~ 광양 중마 시외버스 터미널까지 섬진강을 끼고 달린, 꿈 같은 여행이었다. 수해로 공사 중인 두어 군데를 제외하면 환상적인 자전거 전용 도로를 밟으며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구나, 고맙고 뿌듯했다.
섬진강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과 함께 우리나라 5대 강의 하나로 전라북도 남동부와 전라남도 동부, 경상남도 서부를 흐르는 길이 212.3km의 강이다. 전북 진안군과 장수군의 경계인 팔공산에서 발원하여 들과 산을 적시고 지리산 남부의 협곡을 지나 영·호남 화합의 상징인 남도대교를 지난 다음 광양만으로 흘러 들어간다. 국가 하천으로 지정된 다른 강에 비해 수질이 가장 깨끗한 강이다. 본디 섬진강은 모래가람, 다사강, 사천으로 불릴 만큼 고운 모래로 유명했다. 호남 정맥의 계곡을 흐르는 강으로 주위에 별다른 산업 시설이나 상가, 숙박 시설들이 없어 청정하고 고요함을 간직하고 있다.
섬진강에는 은빛으로 반짝이는 은어를 비롯하여 참게 등 30여 종의 민물고기가 서식한다. 총 유역 면적 중 전남이 47%, 전북 44%, 경남이 9%를 차지하고 있다. 대체로 강 너비가 좁고 타 유역에 비해 산지가 많으며 강바닥의 경사가 심하고 암반이 많아 배가 다니기 힘든 강이다. 하지만 그것이 섬진강이 오랫동안 제 모습을 유지하며 청정함을 간직해온 비결이 아닐까.
섬진강은 물줄기가 지나가는 지역에 따라 몇 가지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데 임실 운암 지역에서는 운암강으로 불린다고 한다. 소설 ‘혼불’의 작가 최명희는 운암강에 대해 “구름이 몸을 이루면 바위가 되고 바위가 몸을 풀면 구름이 된다”라고 했다. 강물 가운데 운치 있는 바위들이 마치 작은 도담삼봉처럼 안개에 싸여 있는 섬진강을 한 폭의 그림처럼 보여주는 명문장이다. 섬진강이 낳고 섬진강이 키운, 섬진강이 자기 삶의 전부라고 하는 김용택 시인의 고향이기도 한 진뫼마을과 천담마을, 구담마을은 오백 리 섬진강 중 가장 아름답고 서정적인 풍광으로 유명하다.
올해 광양 매화 축제에서는 전남 광양시, 구례군, 곡성군과 경남 하동군의 영·호남 4개 시장 군수와 시군 의회 의장, 전남도지사까지 참석한, 섬진강 관광 시대를 열겠다는 선포식이 있었다. 광양 매화 축제, 구례 산수유꽃 축제, 하동 벚꽃 축제, 곡성의 장미 축제 등, 지방의 고유한 문화와 특성을 살려 생태, 문화, 레저가 살아 있는 수변 관광 중심지로 개발하여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원동력으로 삼겠다는 포부가 남달랐다. 하지만 무분별한 개발로 청정한 섬진강이 훼손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아무쪼록 자연의 아름다움을 지키는 개발, 주민들이 더 많이 참여하는 개발, 지역민들 삶의 질을 높이는 개발이 되길 바란다.
진주가 고향이라 하동 근처 섬진강을 몇 번 가 보긴 했다. 하동 송림도 걸어 보고 섬진강을 바라보며 재첩국도 먹어봤지만, 섬진강이 이렇게 매력적인 강인 줄은 미처 몰랐다. 대부분의 한국 사람이 다 아는 섬진강의 아름다움에 대해 뒤늦게 호들갑을 떠는 게 아닌가 싶어 조금은 민망하다.
보름이 지났는데도 눈을 감으면 섬진강이 눈에 선하다. 새벽안개가 피어오르는 신비스러운 모습도 아른거리고 매화와 산수유꽃, 벚꽃 향기도 코끝을 스친다. 섬진강 변 대숲 위에 뜬 보름달과 이슬비 내리고 눈 내리는 섬진강, 하얀 눈이 천지를 뒤덮은 섬진강, 섬진강의 단풍도 그립다. 녹음이 우겨져 나른한 오후의 섬진강과 섬진강의 하늘과 구름, 바람과 노을, 섬진강의 새와 꽃, 그리고 섬진강 사람들과 음식, 장터와 사투리, 사찰 등, 그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싶다.
자전거로 달릴 때 미처 보고 듣고 느끼지 못했던 것을 이 봄이 가기 전에, 쉬엄쉬엄 걸으면서 맛보고 자전거길도 다시 달려보자고 아내와 약속했다. 징검다리를 건너며 강물에 손도 적셔보고 발도 담가 보고, 유유히 흐르는 섬진강의 윤슬을 바라보며 섬진강에게 말도 걸어보고 섬진강이 속삭이는 얘기에도 귀 기울여 보고…. 그러려면 한 달이 아니라 최소한 일 년은 섬진강 변에서 살아야 하지 않을까.
“지치고 힘든, 영혼이 외로운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부르는 것 같은 섬진강을 김용택 시인은 <섬진강 1>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
가문 섬진강을 따라가며 보라
퍼 가도 퍼 가도 전라도 실핏줄 같은
개울물들이 끊기지 않고 모여 흐르며
해 저물면 저무는 강변에
쌀밥 같은 토끼풀꽃,
숯불 같은 자운영꽃 머리에 이어주며
지도에도 없는 동네 강변
식물도감에도 없는 풀에
어둠을 끌어다 죽이며
그을린 이마 훤하게
꽃등도 달아 준다
흐르다 흐르다 목메이면
영산강으로 가는 물줄기를 불러
뼈 으스러지게 그리워 얼싸안고
지리산 뭉툭한 허리를 감고 돌아가는
섬진강을 따라가며 보라
섬진강물이 어디 몇 놈이 달려들어
퍼낸다고 마를 강물이더냐고,
지리산이 저문 강물에 얼굴을 씻고
일어서서 껄껄 웃으며
무등산을 보며 그렇지 않으냐고 물어보면
노을 띤 무등산이 그렇다고 훤한 이마 끄덕이는
고갯짓을 바라보며
저무는 섬진강을 따라가며 보라
어디 몇몇 애비 없는 후레자식들이
퍼간다고 마를 강물인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