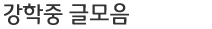일상이 자연 친화적으로 바뀐 것도 큰 수확이다. 계절 따라 새싹과 꽃, 숲길과 계곡, 햇빛과 바람, 새, 달, 별들과 친구하다
보면 멍 때리는 순간도 평화롭다. 질리질 않는 자연의 매력과 생명의 신비에 감탄이 절로 난다.
처음엔 연구소 이전을 반대하던 아내도 이젠 집까지 옮겨서 살 수 있을 것 같단다. 올해는 나보다 더 텃밭 농사에 열심이어서
내가 말리는 지경이다. 아내는 작년에 내가 실패했던 수박 농사(?)에 나 보라는 듯이 성공해, 유난히 수박 값이 비쌌던
올여름 참 달게 먹었다. 가고 싶은 할아버지, 할머니 집이 생겨서 좋아하는 손주들에게 추억을 선물해 줄 수 있어 뿌듯하다.
길어진 코로나로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절감하는 요즈음,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며 단독주택과
전원주택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커졌다. 주택을 다루는 TV프로그램들이 생겨나고 귀농, 귀촌 인구도 늘었다.
아무 연고도 없는 강원도나 지리산, 제주도로 이사하여 행복하게 사는 용감한 가족의 사연도 눈길을 끈다.
하지만 도시의 편리한 생활에 길든 사람들이 순간적인 충동으로 전원생활에 뛰어들었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도 많다.
그런 시행착오를 줄이려면 전원생활의 장·단점, 두 얼굴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자신의 욕구와 가족의 소망 사이, 균형을 유지하면서 나에게 맞는 생활 방식이 무엇인지 꼼꼼히 따져보아야 한다.
무엇보다 부부와 가족의 합의가 중요하다.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는 심각한 부부갈등이나 가족갈등을 일으켜
가족관계에 금이 가게 하고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부르기 때문이다. 덜컥 땅 사서 집부터 짓지 말고 가능하면 전세나
월세로 살아보고 결정하기를 권한다.
영원히 살 것처럼 욕심을 부리지만, 마음이 바뀌고 상황이 변하면 전원생활을 접어야 할 때가 있는 법이다.
1~2년 정도 살면서 입수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 결정을 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다. 처음에는 도시에서 너무 멀지 않은
곳을 추천한다. 처음엔 한두 시간 거리도 즐겁게 오가지만 편리한 도회지 생활에 길든 사람들은 장거리 운전에 차까지
밀리면 결국 전원생활을 포기하고 만다.
집을 짓더라도 작게 짓는 것이 좋다. 아이들이 오면 잘 방이라도 있어야 한다고 집을 키우지만 자주 오지도 않을 뿐더러
필요하면 주변의 펜션을 이용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다. 빈방은 결국 짐만 넣어두는 창고가 되기 십상이다.
관리가 쉬운, 실용적인 집을 짓기 바란다. 관리비만 내면 모든 것을 대신 관리해 주던 아파트가 아니다. 사소한 것
하나까지 내가 직접 관리해야 하는 전원주택의 수리비와 출장비는 부르는 게 값이다. 손재주도 없고 게으른 사람이
수리비나 공사비용을 지불할 경제적인 여유마저 없으면 전원주택은 골칫덩어리가 된다.
공기가 좋아서 시골로 왔는데 뭘 그렇게들 태우는지 연기와 악취에 못 살겠다고 호소하는 사람도 있다.
조용하게 살자고 전원생활을 택했건만 공사 소음과 마을 방송, 밤이고 새벽이고 때를 가리지 않고 울어대는 닭 때문에
시끄러워서 살 수가 없다는 사람들도 많다. 텃밭 가꾸고 잔디밭 넓게 깔고 바비큐 뜯는 즐거움도 잠시, 풀과의 전쟁,
수시로 찾아오는 손님들 뒤치다꺼리에 혀를 내두르기도 한다.
칠흑같이 깜깜한 밤과 각종 벌레, 벌, 뱀 때문에 기겁하고 도망치는 사람도 있다. 조그만 것 하나라도 사려면 차를 타고
몇십 분을 나가야 하고 배달도 안 되고 병원이 멀어 불편하다면서 ‘인 서울’에서의 고층 아파트와 아이들 학원을
고집한다면 일찌감치 전원생활의 꿈은 접는 것이 낫다.
많은 사람이 불편해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오히려 재미있다고 즐기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도시에서 불행했던
사람이 시골에 살면 저절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 세상 살아가는 방법에 한 가지 정답만 존재하는 것은 아닐 게다.
전원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절실한 사람이 많은 것을 내려놓고 또 많은 것을 감내할 때만 더 큰 평화와 자유, 반짝거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음을 명심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