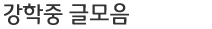박새와 곤줄박이 강학중
박새가 둥지를 튼 우체통 주위로 대여섯 마리나 되는 물까치들이 몰려들었다.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그 때, 아내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 여보! 아유 저걸 어째. 여보, 어떻게 좀 해 봐요”
바람을 날리며 2층에서 달려 내려가니 물까치들이 우체통 속의 박새 새끼를 땅바닥으로 끌어내린 다음 막 쪼고 있었다. 내가 달려드는 바람에 물까치들은 날아가 버렸지만 박새 새끼 한 마리가 바르르 떨고 있다. 우체통에 넣어주려고 조심조심 집어든 녀석은 새털처럼 가볍다. 다른 새끼들이 놀랄까봐 얼른 우체통 문을 닫아주고 집안에서 계속 동정을 살폈다. 어미가 연신 주위를 살피며 벌레를 물고 우체통을 들락날락한다. 어미가 일단 알았으니 조치를 하겠지, 그제야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런데 며칠 후 박새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내가 텃밭으로 나가면 벌레를 물고 우체통 주위를 끊임없이 맴돌며 새끼들을 먹였던 박새였는데...... 혹시나 물까치들이 새끼들을 죽이거나 잡아먹진 않았을까 걱정은 되었지만 둥지를 안전하게 떠나 잘 살고 있겠지, 애써 마음을 달랬다.
작년 봄, 우체통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 가만히 문을 열어보니 노란 부리의 박새 새끼들이 오글거리고 있었다. 혹시라도 새들이 놀라 무슨 일이 생길까 봐 조심조심 돌아서 다녔다. 그랬는데 어느 날 흔적도 없이 박새들이 사라져버렸다. 어디론가 날아갔겠지, 하면서도 얼마나 허전하고 허탈하던지... 합창하듯 벌리던 박새 주둥이가 한동안 눈에 아른아른했다.
올봄, 사용하지도 않는 우체통을 다시 열어보니 둥지는 그대로 있었다. 깃털과 이끼, 작은 나뭇가지.... 혹시나 다시 와서 알을 낳을까 싶어 우체통 문을 끈으로 연결해 펜스에 묶어주었다. 그런데 1,2주일 후, 아내가 뭔가 있다는 것이다. 새가 보인다고! 박새가 또 알을 깐 것이다. 조심조심,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먼발치에서 동정을 살폈다. 그랬는데 물까치 때문에 그런 참사가 난 것이다.
청회색 날개와 긴 꼬리가 유난히 멋있고 품위가 있어 신사라고 불렀던 물까치였다. 참새와 까마귀와는 비교가 안 되는 자태여서 아내에게도 저 새 좀 보라며 권했던 녀석들이었는데, 그 어린 생명에게 하는 짓을 보고 정나미가 똑 떨어졌다. 아내도 깡패 같은 놈이라며 미워했다. 한 번 미운 털이 박히면 하는 짓 모두가 다 마음에 안 드는 걸까? 꺄악 꺅꺅꺅꺅꺅, 시끄럽게 우는 소리도 귀에 거슬린다. 새들 먹으라고 떠다놓은 물도 물까치가 떼거지로 몰려와 독점을 하니 쫓아버리고 싶었다. 밭에 묻으려고 잠시 놓아둔 음식쓰레기까지 건드리는 것을 보고는 실망이 더 컸다. 잡식성으로 과일을 키우는 농부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물까치는 천적이 둥지를 습격하거나 사람들이 어슬렁거리면 집단으로 방어하는 공격적인 녀석이다. 어미가 죽거나 제 역할을 못하면 이모나 삼촌, 누나나 형이 공동육아를 하는 새라고 해서 남다르게 봐왔던 물까치였는데 내가 옹졸한 건지 좀처럼 이뻐지지가 않았다.
양평에 조그만 전원주택을 지어 연구소를 옮기고부터 새와의 인연이 시작되었다. 유리창에 부딪쳐 죽은 새를 두 번 묻어준 적이 있다. 하루는 2층 사무실에서 책을 보고 있는데 유리창에 뭔가 퉁, 부딪치는 소리가 들렸다.
“새다!”
반사적으로 뛰어 내려갔다. 아니나 다를까, 유리창에 부딪친 곤줄박이가 쓰러져 있었다. 똥을 싼 뒤, 꼬리를 질질 끌며 간 흔적이 보였다. 얼른 물에 적셔 정신을 차리게 했더니 눈을 깜박깜박하는 게 아닌가.
‘살았다 살았어! ’
물기를 닦아주고 감기라도 들라, 양지바른 잔디밭에 수건으로 감싸 뉘었더니 한참을 그러고 있다 포로롱 소나무 위로 날아올랐다. 그러고서도 한참을 앉아 있다가 호르르 날아갔다. 살려 준 나에게 고맙다는 인사라도 한 것이었을까. 그 뒤에도 박새 한 마리를 같은 방법으로 살려줬었다.
재작년 봄이었다. 겨울을 이겨내라고 배롱나무 밑동에 깔아두었던 왕겨를 담은 마대 자루를 보일러실 입구에 놓아두었었다. 하루는 보일러실에 가려는데 무슨 소리가 들려 그 안을 들여다보니 세상에! 개불같이 연한 분홍빛 새끼들이 일제히 머리를 쳐들고 노란 부리를 벌리는 게 아닌가. 그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그것도 우리 집에서 새를 보다니, 육십 평생 처음 경험하는 짜릿한 순간이었다. 내가 다가가면 어미가 오는 줄 알고 연신 입을 쫙쫙 벌리며 먹이를 재촉했다. 그러고 둘러보니 혹시나 새끼들에게 해코지를 하지나 않을까 어미가 주위를 맴돌며 안절부절 정신이 없었다. 까만 머리에 흰 뺨, 가슴이 노란 곤줄박이였다. 내 딴엔 달걀을 삶아 노른자도 갖다 주고 물도 떠다 주고 했는데 어느 날 새끼들이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었다. 그 때는 어슬렁거리던 고양이들이 잡아먹은 게 아닐까 고양이를 의심했었다. 안 그래도 고양이를 싫어했는데 고양이만 보면 큰 소리로 쫓아버렸다.
새라고 해야 참새, 비둘기, 까치, 까마귀 밖에 몰랐던 내가 모양과 소리로 구분하는 새가 몇 종 늘었다. 물까치, 멧비둘기 곤줄박이, 박새, 꾀꼬리, 백로, 꿩, 뻐꾹새, 소쩍새, 쏙독새, 검은등뻐꾹새...... 황금빛을 띄고 날아가는 꾀꼬리도 황홀하지만 하얀 날개를 펴고 평화롭게 날아가는 백로를 언덕 위의 연구소에서 내려 보고 있노라면 탄성이 절로 나온다.
하지만 우리 집을 드나드는 새에게 더 애정이 간다. 요즘은 걔들 이름이 궁금하다. 이름 모를 새, 산새, 그냥 예쁜 새라고 부르지 않고 최소한 이름쯤은 기억하는 것이 그들이 주는 기쁨에 보답하는 길인 것 같아 조류 도감과 책부터 샀다. 하지만 요즘은 이름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알고 싶다. 어디서 사는지, 뭘 좋아하는지,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고 취미는 무엇이며 무슨 낙으로 사는지, 요즘 걱정거리는 없는지....... 유튜브나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고 지인에게 물어도 보면서 새의 세계로 점점 빠져들고 있다. 오래 전 공연 관람용으로 사두었던 쌍안경까지 꺼내들고 새를 좀 더 가까이 눈에 담으려고 애를 쓴다.
그러나 아직은 모든 새가 다 예쁘지는 않다. 물까치는 여전히 밉상이고 묻어놓은 음식쓰레기를 마구 파헤치는 까마귀도 비호감이다. 참새들이 좋아하는 현미를 독식하는 멧비둘기는 내가 가까이 가도 별로 놀라지도 않는다. 뒤뚱거리는 걸음걸이가 영 마음에 안 든다. 모든 생명이 다 예뻐보이는 경지는 언제쯤 도달할 수 있을지......
우리 집을 찾는 새들을 좀 더 가까이 보고 싶어 올 겨울엔 새집을 달아줄 예정이다. 둥지 하나를 장만하기 위해 새들이 얼마나 눈물겨운 수고를 하는지 잘 알기 때문이다. 중요한 건축자재로 쓰일 수 있는 솜도 나무에 달아주고 부족한 지방분을 보충하라고 돼지기름도 걸어 주고 호두나 잣, 땅콩도 준비할 계획이다. 요즘도 신선한 물을 매일 갈아주고 있다. 현미나 조를 수시로 뿌려주다가 새들이 지나치게 의존할까 봐 추위를 견뎌야 하는 겨울에만 주기로 했다.
작년과 올해, 소리도 없이 사라진 곤줄박이와 박새가 고양이나 물까치에 피해를 당하지 않았기를, 그리고 안전한 곳으로 날아갔기를 빌어본다. 그리고 비교적 경계심이 약한 곤줄박이가 내 어깨나 손바닥에 날아 앉아 잣이나 들깨를 먹는 날이 오기를 고대한다. 할아버지와 새가 어울리는 모습을 보면 손녀들이 또 얼마나 괴성을 지를지, 벌써 눈에 삼삼하다.
2020/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