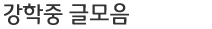-주란이 옆 차선을 살피다 재빨리 문을 열고 탔다. 문이 열렸다 닫히는 사이로 뒤에서 득달같이 달려온 트럭의 소음이 회오리처럼 휘익 밀려왔다 사라졌다.
-창밖으로는 사붓사붓 눈이 내리고 방문 틈으로는 아롱아롱 주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숲 전체에 깜깜한 어둠이 내릴 때쯤 그들의 정신은 물에 풀린 물감처럼 아득해졌고 그들의 육체는 완전한 모호함 속에 잠겨버렸다.
3,4년 전 읽었던 권여선의 소설집 <안녕 주정뱅이>를 다시 읽어보았다. 어떤 술자리에서도 결코 먼저 일어나자는 말을 한 적이 없는 작가의, 술 마시는 장면이 자주 나오는 일곱 편의 단편집이다.
돌이켜보면, 몇 년 전 처음 이 책에 손이 간 이유가 가슴에 와 닿는 문장 때문이 아니었을까. ‘인생이 던지는 지독한 농담이 인간을 벼랑 끝까지 밀어뜨릴 때, 인간은 어떠한 방식으로 그 불행을 견뎌낼 수 있을까, 미세한 균열로도 생은 완전히 부서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리고 그 비극을 견뎌내는 자들의 숭고함을 가슴 먹먹하게 그려낸 작품’이라는 서평에 나도 모르게 끌렸다.
책을 읽으면서 문장의 향기에 내내 취해 있던 기억이 난다. 그래서 닮고 싶고 배우고 싶어 밑줄을 쳐 둔 문장들을 필사해 보았다. 온라인 공간에 모든 것이 담기고 눈 깜짝할 사이에 복제되는 21세기에 ‘필사’라니! 내 딴에는 글을 잘 쓰고 싶다는 소망으로 실천에 옮긴 일이다. 남의 글을 천천히 베껴 적는 사람들은 대개 글을 정독하고 음미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내 글을 갈고 닦기 위해서 필사한다. 정독과 음미에 더하여, 흉내 내어 글을 더 잘 쓰고 싶은 마음이 크다. 한동안 문장의 향기에 취해 뭔가를 끄적이다 보면 내 글에도 그 향기가 조금은 묻어날 것 같은 착각에 빠진다.
글에 대한 나의 짝사랑은 언제쯤 시작된 것일까? 그러고 보니 중 3때 교지에 단편소설을 투고한 적이 있다. 국어 선생님이 추천해 주신 백수사의 한국단편문학전집 다섯 권 전권을 읽고 그 감성에 젖어 써 본 글이다. 20대 후반에는 주례를 서 주신 아동문학가 선생님께 내가 쓴 동화를 보여드린 적도 있다. 사보를 만들고 사사를 편찬하고 월간 잡지와 주간 신문을 창간하는 일을 주관하면서 오랫동안 활자 매체와 관련된 일을 한 것이 30년 전이다. 하지만 내 글에 늘 만족하질 못했다. 마음에 차지 않는 글을 내놓자니 마음이 무거웠다.
강의를 하고 방송에 출연하는 것에는 큰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지만 원고 청탁을 받고 글을 쓸 때는 항상 마지막까지 끌탕했다. 첫 책을 낼 때에도 받았던 계약금을 돌려주며 출간을 연기할 만큼 스트레스를 받았다. 하지만 9년 후, 두 번째 책을 내면서도 별로 나아진 것이 없었다. 사실 양으로만 따지면 그동안 꽤 많은 글을 써온 셈이다. 기업이나 잡지사, 신문사의 청탁을 받아 ‘가족’과 관련된 칼럼을 계속 써왔으니 말이다. 그런데 어째서 여전히 내 글엔 만족하지 못 하는 것일까? 지식이나 교훈을 담아야 한다는 강박으로 이내 딱딱해져버리는 나의 글. 사람의 마음을 적시는 서정적인 글을 쓰고 싶은데 그러기엔 어휘가 부족하고 표현이 딸린다. 문장과 문장이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고 툭툭 끊기는 느낌이다. 부족한 글이나마 즐겁게 쓸 수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마감까지 하루하루 시간을 동냥해서 연명을 하듯이 꾸역꾸역 분량을 채워나간다.
두 번째 책을 낼 때에는 미친놈처럼 고함을 지르고 집이 떠나가라 음악을 크게 틀어놓기도 했다. 글을 쓴다는 게 원래 영혼을 쥐어짜는 고역이라지만, 모든 작가들이 다 이렇게 고통을 받으며 글을 쓰는 것은 아니리라. 숨을 쉬듯, 노래를 하듯 글을 쓰는 사람들도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그들의 비법이 궁금하고 부럽다.
그런데 타고난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면서, 부러워만 하고 노력도 없이 울림이 있는 글을 쓰고 싶어 했다.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쓸 수 있느냐고 물으면 사람들은 한결같이, 무조건 많이 읽고 매일 쓰라고 한다. 그러나 너무 교과서 같은 충고로 들려 실천은 하지 않고 좋은 글을 쓰고 싶다는 욕심만 내왔었다. “타고난 재능이 있어야 작가가 되는 것은 아니며 글을 쓰고 있으면 이미 작가다”라는 주위의 위로 또한 별로 마음에 와 닿지 않았다. 엉거주춤한 채, 세월만 보내온 것이다.
그러다가 최근에 결심 한 가지를 했다. 일주일에 최소한 글 한 편씩은 써보겠다고, 그리고 3년에 한 권씩 책을 내보자고. 스스로 마감을 정하고 글을 쓴지 이제 두 달 정도 된다. 겨우 두 달인데도 내가 정해놓은 그 마감 시간을 깨버리고 싶은 유혹이 매번 달려들어 괴롭다.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사서 고생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억울함에 우울해지기도 한다. 그러나 목표를 일단 세워놓으니 일상의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효과는 확실하다. 뭐든지 예사로 보지 않고 유심히 관찰하게 되고 글감을 발견하기 위해 일부러 체험을 자청하기도 하는 장점도 있다. 숲길을 걸으면서, 밤중에 마당으로 나가서 별과 달을 쳐다보며 가슴 속에 일렁이는 내 감정의 흐름을 놓치지 않으려고 귀를 기울인다. 또한 남의 글도 더욱 유심히 본다.
유독 향기가 나는 글은 눈으로만 읽지 않고 필사하기로 했다. 이제 막 그 첫 삽을 뜬 셈이다. 아직은 힘이 들어 미루고 회피하고 싶은 글쓰기이지만 조금씩 나만의 틀이 잡혀져가는 것 같아 기쁘다. 글 쓰는 근육이 발달하다보면, 글쓰기가 즐거운 날도 언젠간 오겠지? 그래서 자연스럽게 좋은 글이 더 많이 탄생하기를 바라며, <안녕 주정뱅이>에 대한 소설가 김서령의 단상을 필사해 본다.
-하나같이 사랑스럽고 하나같이 슬퍼서 아이고, 저 한심한 주정뱅이들! 이라고 욕도 못 한다. 그들이 들려주는 주정의 역사와 핑계가 어찌 그리 안쓰럽고 다정한지 나도 슬그머니 그들 사이에 엉덩이를 들이밀고 소주 한 잔 들이켜고 싶어지는 것이다. 작가 말고, 그 주인공들을 진짜 만날 수만 있다면 내가 돼지껍데기도, 청양고추 송송 썰어 넣은 빈대떡도 사줄 수 있는데, 그럴 수 있는데.
2020/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