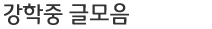며칠 사이에 초록색 봄 물결이 온 세상을 덮었다. 내 비밀 산책로도 파아란 풀밭으로 변해버렸다. 나비가 팔랑팔랑 날아와 숲길을 안내한다. 아침 숲 공기가 달다. 나뭇잎 사이로 비치는 햇빛을 안고 숲길로 들어서니 속세에서 선계로 접어드는 기분이다.
“째재재재잭 짹 짹, 짹”
“삐리삐리 삐리리리릭”
“꿔엉 꿩 꿩”
“구우구우 구구구구”
산비둘기와 꿩, 이름 모를 새들의 아침 합창이 감미롭다. 그새 어떻게 지냈는지, 밤새 어떤 꿈을 꿨는지 내 귀에 속삭이는 소리가 정겹다. 어떤 녀석은 ‘포르 포르 포르릉’ 날아가는 날갯짓 소리가 선명하게 들릴 정도로 주위를 맴돌기도 하고 어떤 녀석은 내 앞을 총총총총 뛰어가면서 연신 무언가를 쪼아 먹기도 한다. 마지막 남은 벚꽃 한 장이 살랑 살라앙, 나비처럼 날아 앉는데 정작 살아있는 나비는 돌 위에 움직이지도 않고 앉아 있다. 따뜻하게 데워진 돌의 온기를 느끼며 잠시 휴식이라도 취하는 걸까. 가만히 쪼그려 앉아 바로 코앞까지 다가가도 전혀 경계를 하지 않는다. 오랜 가뭄 끝에 비가 두어 번 오더니 졸졸졸졸 계곡물 소리도 이쁘다. 그 물에 떠내려오는 낙화가 안타까울만큼 아름답다. 30미터나 될법한 메타세콰이어 등걸에도 파아랗게 새 잎이 돋았다. 조심스럽게 만져보는 연한 잎들은 우리 윤슬이 손가락처럼 보드랍고 사랑스럽다.
생명의 힘은 참으로 놀랍다. 겨우내 언 땅을 뚫고 여린 뿌리는 힘차게 물을 빨아올렸다. 뿌리털과 잔뿌리가 있는 힘을 다해 빨아올린 시리도록 찬 물이 메말랐던 줄기를 부풀어 오르게 하고 잎에도 윤기가 자르르 넘치게 한다. 그 물이 기어이 겨울눈을 밀어내고 연한 잎들을 틔웠다. 저 여린 싹을 틔우기 위해 마른 나뭇가지들은 눈을 덮고 긴 잠을 자며 겨울 내내 기다렸으리라. 뿌리가 흙으로부터 생명의 물을 모아 뿜어 올리기를.
낙엽과 솔잎을 걷고 그 아래 숨어 있는 흙을 헤집어본다. 보드라운 흙냄새가 싱그럽고 은은하다. 그러고 보면 도회지에 사는 사람들은 일 년 동안 흙 한 번 못 만지고 살 것이다. 손으로 이 부드러운 촉감을 맛본다는 것은 보통 호사가 아니다. 그러나 내 작은 호사를 위해 생명을 해칠 수는 없다. 화들짝 놀란 지렁이가 말라죽을까 봐 얼른 흙이불을 덮어주었다. 저 한 줌의 흙 속에도 60억 마리의 미생물과 생물이 산다니! 햇볕을 받아 깨어난 땅 속의 물과 뿌리의 신비에 잠시 마음이 경건해진다.
살아남기 위해 생명은 저마다 최선을 다한다. 키 큰 나무들과 더 큰 식물들이 햇빛을 독점하기 전에 하루라도 더 빨리 나오기 위해 혹독한 추위를 뚫고 올라온 야생화들의 몸부림이 눈물겹다.
“일어나, 봄이 왔어. 다른 애들이 깨기 전에 얼른 햇볕을 쫴야지”
다들 햇빛이 재촉하는 소리를 들었을까? 두 차례 봄비가 내린 뒤 연두와 초록이 더욱 선명해졌다. 푸르름 속에 짙고 옅은 신록들이 꽃보다 아름답다. 나뭇잎과 꽃, 크고 작은 산짐승들의 환호 소리에 봄 축제가 무르익는다. 가벼운 바람에도 연신 까르르 까르르 웃는, 부드러운 풀잎과 꽃잎들의 웃음소리에 내 마음도 가볍다. 조금이라도 먼저 벌과 나비를 불러 모으기 위해 현란한 색깔과 모양, 냄새와 꿀로 유혹하는 꽃들이 환하게 웃는다. 시간날 때마다 찾는 연구소 근처의 중미산 국립휴양림의 풍경이다.
그 어떤 과학자나 마술사도 풀 한 포기, 지렁이 한 마리를 만들지 못한다. 그렇게 자연은 신비롭고 위대하다. 물과 햇빛, 공기만으로 나무와 온갖 동물들과 바람의 놀이터를 만들어내는 숲이야말로 모든 생명의 근원이자 출발점이다. 사람은 태어나서 기껏해야 스무 배쯤 자라지만 1g정도 밖에 안 되는 씨앗은 수십 톤의 거목으로 자라나니, 숲이야말로 참으로 위대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100년 된 상수리나무 한 그루는 무려 630리터의 물을 끌어올리는 펌프이며 숲은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녹색 댐이다. 숲이 만들어내는 쓰레기라는 게 청정한 산소와 깨끗한 물이다. 산소와 물이 없으면 생존조차 못하는 인간에게는 숲이야말로 참으로 소중한 축복이다.
더구나 요즘처럼 황사와 미세먼지로 고민하는 시대에는 숲은 더욱 더 고마운 존재가 아닐 수 없다. 도시의 유리나 시멘트, 대리석은 먼지를 흡수하지 못한다. 하지만 숲 속 공기는 나뭇잎의 거친 표면이나 솜털, 줄기, 울퉁불퉁한 껍질, 그리고 땅 위의 낙엽에도 먼지를 달라붙게 한다. 1헥타르의 숲이 한 해 동안 60톤 이상의 먼지를 가둔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 공기정화기인가.
하지만 이런 숲을 훼손하고 오염시키고 닥치는 대로 채취하면서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니 낯 뜨거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제부터라도 인간 중심의 이용가치만 따지지 말고 숲과 더불어 숲 속의 일원으로 함께 사는 지혜를 배울 일이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더 이상 생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어느 날 숲속의 나무들이 더 이상 광합성을 하지 않겠다고 파업이라도 하면 우리 인간은 숨조차 쉴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숲을 향유하며 삶의 여유를 누리기 위해 반드시 울창한 숲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주변에 가까운 숲, 준비된 숲이 얼마나 많은지 둘러보자. 숲에는 나무만 있는 게 아니다. 나무와 흙, 햇빛과 물, 비와 바람, 구름, 안개, 소리, 나비와 벌, 개미, 어치, 딱따구리, 다람쥐, 고라니, 지렁이와 달팽이 까지 모든 게 숲속에 사는 가족들이다. 푸른 숲을 눈에 담아도 보고 푹신푹신한 낙엽 위에 누워서 나뭇잎 사이로 흘러가는 구름도 세어 보자. 무심히 지나치지 말고 나무를 살포시 포옹도 해 보자. 꺼칠꺼칠하지만 수분 증발을 막아주고 더위와 추위, 그리고 곤충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껍질은 나무의 든든한 수호신이다.
나무와 꽃 이름을 꼭 많이 알아야하는 것은 아니다. 과학적 지식에만 매달릴 일도 아니다. 과학적 지식은 사물이나 생물의 본질까지 설명해 주지는 못한다. 있는 그대로 보고 듣고 만져 보고 맡아보고 맛보면서 온 마음을 열고 온 몸으로 숲을 느끼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운동한답시고 무슨 극기훈련 하듯이 무리하지 말고 그저 천천히 햇볕을 받으면서 숲길을 걷기만 하면 된다. 그러다 잠시 걸음을 멈추고 숲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자. 잠깐 쪼그려 앉아 유심히 들여다보면 예쁘지 않은 풀, 이쁘지 않은 꽃이 없다. 이름 모를 풀들과 꽃들을 잡초라고 부르는 것은 무례한 짓이다. 모두 다 아름답고 꼭 필요한 존재들이다. 썩어가는 나무와 동물들의 사체까지도 온갖 박테리아와 버섯들 덕분에 다시 자연으로 순환하여 우리 인간에게 공기와 물, 푸르름을 선사하지 않는가.
인간은 숲 없이 살 수 없지만 숲의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인간의 눈에 안 띄기를 바랄지도 모른다. 층간소음으로 다투는 인간들이 이제 숲으로 들어가기 전, 숲의 세계로 입장해도 좋은지 허락이라도 받고 들어가야겠다. 마음이 각박하고 상처가 많은 사람도 숲에 들어서면 치유를 받는다. 햇볕을 쬐며 숲길을 걸으면서 바람의 의미와 햇빛과 물의 뜻을 헤아리다 보면 마음에 평화가 넘친다. 행복감이 충만해진다.
곧 신록의 색깔을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녹음이 우거질 것이다. 온 숲을 단풍으로 물들이는 가을과 온 세상을 하얀 눈으로 덮어줄 겨울도 차례로 다가올 게다. 그리고 온갖 생명들이 기지개를 켜는 합창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봄도 어김없이 다시 찾아오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