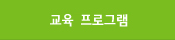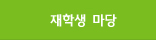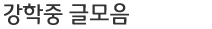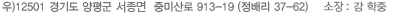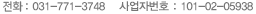“혼례보다 결혼생활과 부모됨을 위한 준비에 더 많은 자원, 에너지 투자해야”
KBS에 근무하는 C아나운서로부터 연락이 왔다. 곧 결혼할 예정인데 주례를 좀 서 줄 수 없겠느냐는 전화였다. C아나운서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초대 손님으로 딱 한번 출연한 인연으로 선뜻 주례를 서겠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주례를 아무에게나 부탁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에 수락을 했다. 몇 주 전, 여성가족부가 주최한 건전한 혼례문화 100인 선언식에서 사치스러운 결혼식의 주례는 가능하면 맡지 않겠다고 서명한 적이 있었는데 결혼식을 KBS 신관에서 한다고 해서 부담이 덜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바뀌어야 한다고 말들은 하면서도 좀처럼 바꾸지 못하는 것이 결혼식 문화다. 결혼식은 양가의 자존심으로 비화하는 경우도 많아 의견을 말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바람직한 결혼식 문화로 바꿀 수 있을까.
첫째, 분수에 맞는 결혼식을 준비해야 한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나 기죽지 않기 위해 분수에 넘치는 결혼식을 치르느라 빚까지 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한번의 결혼식을 위해서 꽃값으로 몇 천만 원씩이나 쓰는 결혼식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꽃값뿐만 아니라 드레스, 신부화장 비용 등도 만만치 않다. 1인당 10만∼20만원에 가까운 호텔 식사비용만 줄여도 크게 절약할 수 있는데 꼭 식사를 대접할 필요가 있을까. 간단한 답례품으로 감사를 전해도 좋겠다.
신랑 신부나 부모님과 전혀 인연도 없는 가수나 아나운서를 불러 결혼식의 축가나 사회를 부탁하면 결혼생활이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인지도 의심스럽다. 언제부터 시작된 것인지 국적부터 의심스러운 몇몇 결혼식 프로그램은 다분히 예식장의 상술로밖에 보이지 않음은 나만의 생각일까.
둘째, 부모님 잔치에 자식들이 출연하는 결혼식이 아니라 신랑 신부가 주인공이 되어 진정한 성인으로 거듭나는 결혼식이 되어야 한다. 자식들 결혼시키는 것을 마지막 의무로 생각하는 부모들의 인식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스스로 번 돈으로 결혼식을 치른다고 하면 결코 호화스런 결혼식을 올리기 어렵다.
부모가 한 푼도 안 보태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본인들이 일부를 부담하거나 결혼식 비용을 당사자들에게 다 주고 그 범위 안에서 스스로 지출 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평생에 한번밖에 없는 결혼식’이라는 함정에 빠지지만 않아도 분에 넘치는 결혼식을 피할 수 있다. 결혼 10주년, 20주년, 30주년에 두 사람이 뜻 맞추어 다시 올리는 결혼식도 잊을 수 없는 두 사람만의 추억이요 자산이 될 수 있다.
셋째, 결혼식의 의미를 시대에 맞게 재해석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모든 형식을 다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에 따라 예전의 뜻이 별 의미가 없어졌다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생략하거나 얼마든지 간소하게 치를 수 있다. 돈 주고 사서 보내는 이바지 음식이 대표적인 예인데 예단을 누구에게까지 보낼 것인가 그 범위를 정하기조차 어렵다면 부모님만으로 제한하거나 부모님 스스로 예단을 생략하자고 제안한다면 큰 고민을 없앨 수 있다.
그러려면 아들 가진 부모의 배려와 결단이 필요하다. 아직도 딸 가진 부모들이 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것이 한국의 정서이기 때문이다. 직계 가족과 아주 가까운 친척, 친구들로 하객을 제한하거나 결혼식을 주중 저녁에 치르는 것도 환영할 만한 일이다. 결혼식에 참석하는 사람 역시 눈도장만 찍고 식당으로 직행하거나 결혼식이 진행되는 도중에 소란을 피워 경건하게 치러야 할 남의 결혼식을 망치는 결례를 범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결혼식 준비도 중요하지만 결혼생활이나 부모 됨을 위한 준비에 더 많은 자원과 에너지를 투자해야 함을 명심하자. ‘틀린 말은 아니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으니 어디 그게 쉬운 일이냐’는 변명은 이제 그만하자. 그 현실을 만든 사람 역시 우리임을 인정한다면 ‘나부터’ 그렇게 할 일이요 ‘나라도’ 검소하게 치를 일이다. 화려한 결혼식이 결혼생활의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님을 잊지 말자.
[출처]국민일보 문화칼럼 청사초롱
[필자] 강학중(가정경영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