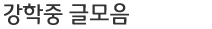|
 |
 |
이 시대의 대가족이란? (강학중/ 가정경영연구소 소장) |
 |
 |
관리자 |
 |
 |
 |
2008.09.09 |
 |
 |
 |
4567 |
|
|
아내와 엘리베이터에 오르자 귀여운 꼬마 녀석이 엄마와 함께 타고 있었다. 까만 눈망울이 귀여워 고사리 같은 손을 살며시 잡았더니 낯이 설었는지 슬며시 손을 빼곤 엄마 뒤로 숨어 날 빤히 쳐다보는 것이었다. 그들을 두고 내리며 못내 아쉬운 표정으로 손을 흔드는 나에게 아내는 내리자마자 핀잔을 주었다.
모르는 사람이 자기 아이를 만지는 것, 요즘 젊은 엄마는 싫어한다고, 예쁘다고 한 마디 하는 건 괜찮지만 만지긴 왜 만지느냐고, 여자 아이라면 무슨 오해를 받으려고 그러느냐는 것이었다. 원래 아이들을 좋아하는 편이기도 했지만 요즘 들어 부쩍 어린 애들을 귀여워하는 것이 나이가 들어서인지 모르겠다. 정작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는 큰 관심도 없이 바쁘기만 했던 남편이 뒤늦게 남의 아이들에게 관심 갖는 것이 아내는 서운했을까.
우리 아이들이 원한다면 결혼해서 한 집이나 가까운 이웃에서 함께 사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는 내 말에 아내는 동의하질 않았다. 아이들이 함께 사는 것을 좋아하지도 않을뿐더러 당신이 아이를 봐 준 다는 것도 잠시, 결국은 자기 몫이라는 얘기였고, 이제는 아내도 자신의 생활을 좀 즐기고 싶다고 했다. 조목조목 다 맞는 얘기여서 뭐라고 반박할 순 없었지만 아이들이 찬성하고, 미래의 사위나 며느리가 반대하지 않는다면 나쁠 것도 없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았다. 하지만 솔직히, 모여 살면 서로 불편하거나 갈등이 생길 것을 은근히 두려워하는 마음, 자식들만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 부모도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걱정이 있기도 했다.
그런데 모 방송국의 가족 관련 프로그램에 패널로 매일 출연하면서 내 생각에 약간의 변화가 생겼다. 대가족으로 함께 모여 사는 것이 반드시 나쁘기만 한 것도 아니라는 생각에 확신을 더하게 해주는 ‘행복한 가족들’을 만나면서 아내와 다시 한 번 의논을 해 봐야겠다는 생가기 든 것이다.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자식들이나 며느리들이 어려움이나 불편함을 솔직하게 털어놓기도 하고 더러는 조심스럽게 감추기도 했지만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많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는 출연자들의 얘기에 공감이 갔다. 따로 살 것인지 모여 살 것인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것이 더 행복한지의 문제며 갈등과 불화를 어떻게 조절하고 해결할 것인지의 지혜가 관건이었다.
그런데 3대나 4대가 오순도순 행복하게 모여 사는 그 대가족들에게는 묘한 공통점이 있었다. 일흔이나 여든, 아흔을 넘긴 나이에도 대단히 건강하고, 그 연세에도 시장에서 짐을 나르고, 퀵서비스에 종사하거나, 농사를 짓고, 식당일을 돕는 등 자기 일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못 먹고 못 입고 고생하던 시절을 겪어오면서 자식들 공부시키기 위한 생존 전략이기도 했겠지만, 한결같이 검소하고 절약하는 ‘알뜰맨’이었다. 그리고 때로는 군림하는 남편이나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인내하는 아내와 자식, 며느리, 나름대로의 리더십과 융통성을 가지고 변화에 적응할 줄 아는 가장으로 놀라운 조화를 이루며 살고 있었다.
개인의 행복이나 민주화, 평등을 주장하는 젊은 세대들의 가치관으로 보면 여성의 희생이나 자식들의 복종을 전제로 하는, 대단히 비민주적이고 구속받는 삶 같이 보인다. 하지만, 어려운 세월들을 지혜롭게 이겨낸 후 맛보는 만족감이나 행복감,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 한다는 자부심은 그 어떤 것과도 바꾸고 싶지 않다고 했다. 50~60년, 70~80년을 뛰어넘는 세대와 남녀 간의 차이를 극복하며 다양한 인간관계와 세대 간 의사소통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것도 핵가족에서는 경험하지 못하는 튼 수확이며 형제나 동서들 간의 동료애와 협동심을 배울 수 있는 성장의 기회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부모님을 모시는 것이 꼭 부담만 주는 것은 아니어서 아이들도 봐 주시고 생활비도 절약되며 할아버지, 할머니와 살면서 아이들이 생각도 깊어지고 예의를 갖출 줄 아는 장점도 있다고 했다.
진정으로 아이들이 원하고, 사위나 며느리가 찬성한다면 함께 사는 대가족으로서의 매력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다. 한 지붕 밑에서보다는 같은 아파트 단지나 가까운 거리에 살면서 자주 만나고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사이가 좋을 것이다. 그들이 사는 방식이나 자녀 양육 방법, 돈 씀씀이 등 자식들의 삶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면서 ‘따로 또 같이’의 지혜를 모은다면 새로운 우리 집만의 가족문화를 창조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기대에 가슴이 설레 일 때가 있다. 혼자 살고 싶은 욕구와 더불어 살고 싶은 인간의 욕구를 함께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그래도 괜찮은 제도가 가족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참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해 본다. 건강도 챙기고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경제력과 ‘내 일’을 가지면서 무엇보다 오래오래 친구로 남아 다정하게 손잡고 산책할 수 있는 아내와의 사랑에 열심히 물 주고 거름 주어야겠다.
[출처] 디어패밀리 04년 11월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