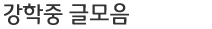|
친구의
자살
며칠 전 고등학교 동창 한 명이 스스로 이 세상을 등졌다는 소식을 들었다. 남편과
아빠의 갑작스런 죽음이 가족들에게 남겼을 상처의 깊이를 생각하니 가슴이 저렸다. 자신이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어야 참부부일 텐데,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진정한 가족일 텐데…. 친구의 부음 소식을 듣고 과연 우리 부부와 우리 가족은 어떤가를 돌아보았다.
내가 과연 몇 살까지 사는 것으로 가정하고 노후 대비를
해야 할지 점검해 본 적이 있다. 그때 나는 웰빙(well-being) 바람에 맞춰 최고 수명을 90세에서
100세로 수정했다. 그런데 웰빙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웰다잉(well-dying)’이
아닐까. 고통스럽지 않게, 후회 없이 나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것 또한 큰 복일 테니까. 그런 웰다잉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나누면서 살아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언젠가는,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진리를 우리는 참 많이 잊고 사는 게 아니냐면서 아내와 꽤 구체적인
대화를 나눴다. 먼저 떠나면, 좋은 사람 만나 잘살라는 것과 화장을 해 달라는 얘기까지 아내와 내 의견은 잘 맞아떨어졌다. 어느 한쪽이 치매에
걸리면 너무 고민하지 말고 병원에 입원시켜 달라는 당부도. 내가 먼저 죽으면 장기와 시신을 기증하고 샆다는 얘기에도 아내는 반대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내친김에 얼마 되지도 않는 재산으로 훗날의 분란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유언장을 한번 써 보기로
했다.
아이들은 난데없이 무슨 유언장이냐며 펄쩍 뛰었다. 하지만 친구의 죽음을
통해 가족 구성원과의 갑작스런 사별이 한 가정을 얼마나 크게 뒤흔드는지를 보았으므로 아이들에게도 알아듣게 이야기해
주었다.
사별의 고통 앞에서 방황하고 괴로워하는 많은 가족들의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들에게 지나친 죄책감으로
자신을 괴롭히지 말라고 위로하곤 했다.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마음의 상처와 함께 찾아오는 육체적인 고통과 후유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가족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진지한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다. 잘 죽는 것, 그것이 잘 먹고 잘 사는 일 못지않게 중요한 것임을 절감하게 한 친구의
죽음이었다.
[필자] 강학중 (가정경영연구소 소장)
[출처] 좋은생각 2006
3월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