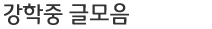한 달만에 만나는 가족 모임, 아들 녀석이 훈련소에서 퇴소한 뒤, 함께하는 자리여서 더욱 반가왔다. 그러나 큰 형님이 주문을 시작하자 형수님이 한 마디 거들었다. 너무 많이 시키지 말라고, 늘 음식이 남지 않느냐고, 이 쪽 테이블의 여자들과
아이들은 회 말고 초밥만 시켜주면 딱 좋겠다고. 그러나 형님의 음식 주문은 끝이 없었다.
덕분에 나는 좋은 술에 신선한 회까지,
모처럼 화기애애하게 형제의 정을 나누었지만 아이들과 여자들은 벌써 배가 부르다며 이번에도 역시 음식을 남겼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이들은 ‘정말 먹고 싶은 초밥만 시켜 주면 음식값도 적게 들고 더 맛있게 먹었다는 느낌이 들텐데 큰 아빠는
왜 매번 음식을 많이 시키시는지 모르겠다’며 불평 아닌 불평을 했다. 나는 되물었다.
“왜 큰아빠가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하니?”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아이들이 대답했다.
“정말 맛있는 것을 사 주고 싶어서 그러셨겠죠.”
나는 단골집이라 매상을 좀 올려주고
싶어서 그러셨는지도 모르고 늘 윗 자리에서 지시하는 입장이다 보니 습관이 되어 그랬을 수도 있을 거라고 한마디 덧붙였다.
하지만 얘기를 하고 보니 난 또 어땠었나 싶어서 부끄러웠다.
내가 주고 싶은 것, 줄 수 있는 것을 내가 주고 싶을 때 내 방식대로
주고 나서는 고마워할 줄도 모른다고 아이들에게 서운해 한 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나는 반성했다. 비디오 테이프를 빌리고 책을
사 줄 때에도 아이들의 관심사나 취향하지 않고 교훈적인 것을 일방적으로 강요한 적은 없는지, 외식하러 가면서 나 역시
‘이거 비싼 거야. 이게 몸에 좋은 거야. 그런 음식은 안 좋은 거야’하고 아이들의 식성을 무시한 적은 없었는지...
내가 생각하기에 별로 바람직하지 않더라도 아이들의 기호나 취향을 위해 내 주장을 한 번쯤 양보해도 좋았으련만! 아이들을
위한 사랑과 관심이 잔소리나 간섭이 아닌 진정한 사랑으로 느껴지게 하려면 어떤 방법이 효과적이고 지혜로운지를 생각해
본 기회였다.
[필자] 강학중(가정경영연구소 소장)
[출처] 좋은생각 2006 2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