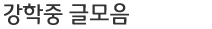|
다롱이
아들 녀석이 친구로부터 강아지 한 마리를 얻어 왔다. 시츄라는 조그만 강아지로 생후 2개월이라고 했다.
강아지, 강아지, 아이들이 노래를 불렀건만 사람들이 모여 사는 아파트에서는 안 된다며 거절했던 것인데 대학생이 다 된 녀석들이 또 다시 조르는
바람에 양보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물론 주민회의에서도 강아지 기르는 것을 양해하는 쪽으로 결정이 나고 아내가 동의를 해 주어서이기도 했다.
그러나 다롱이라고 이름을 지어 준 이 녀석을 키우는 것이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었다. 세 끼 먹이 챙겨 주랴
용변 보는 것 길들이랴, 예방 접종 시키러 병원 데리고 다니고 목욕시키고 말리고, 게다가 밤 중에도 와서 낑낑거리는 녀석을 달래느라 잠을 몇 번
설치다 보니 완전히 갓난 아이 하나를 다시 키우는 것이 아닌가 싶었다.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고 잘 키우겠다고 약속하며 데려온 강아지를 다시
주인에게 돌려보낼 수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주자니 또 한 번 이별의 아픔을 겪을 녀석의 눈망울이 밟혀 영 마음이 편칠
않았다.
그런데 다롱이를 다른 사람에게 주어버리자던 아내가 자기가 힘들더라도 키우겠다고 마음을 돌리면서 다롱이와
한가족이 되기로 마음을 굳히자 모든 것이 오히려 즐거움으로 다가왔다. 눈 뜨기가 무섭게 달려들며 꼬리를 흔드는 녀석을 보며 하루를 기쁨으로
시작할 수가 있었고 아무리 밤 늦게 들어가도 어김없이 달려나와 날 반기는 강아지 때문에 귀가를 서두르는 때도 있었다. 그리고 하루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다롱이의 모습을 보며 깜짝 깜짝 놀라기도 하면서 참 많은 것을 생각하고 느끼고 배우는 요즈음이다.
밤에는 당연히 아들 방에서 자는 것으로 알지만 잠만 깨면 안방 문을 긁어대며 낑낑거리는 녀석 때문에 문을 열어
주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로 고문을 당하듯이 괴로웠던 적이 있었다. 하지만 몇 날 아침을 독하게 마음을 먹고 견뎌냈더니 다롱이는 신기하게도 문
앞에서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닌가. 먹이를 줄 때마다 어쩔 줄을 몰라 밥그릇이나 물그릇을 엎지르기 일쑤였던 녀석에게
‘기다려’를 가르치는 것도
결코 쉽지가 않았다. 바로 코 앞에 먹이를 두고도 ‘기다려’
하면 가장 원초적인 그 식욕까지도 참아내는 다롱이였다. 자기 먹이를 다 먹고도 우리가 식사를 할 때면 식탁 밑에 와서 빤히 쳐다보며 먹을 것을
달라고 낑낑대는 녀석을 애써 외면하는 것도 또 다른 고통이었다. 하지만 일관되게, 사람 먹는 것과 강아지 먹는 것을 구분하며 반응을 보이지
않으니까 언제부터인지 포기를 하고
혼자 놀았다.
그리고 녀석을 홀로 두고 외출하면서도 ‘갔다
올께’
한 마디면 더 이상 보채질 않고, 제대로 용변을 볼 때마다 온 식구가 달려나와 ‘까까’를 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더니 대소변도 곧잘 가리는 의젓한 강아지가 되었다.
최근 몇 주, 어른이 다 되어서도 속 썩이는 자식들 때문에 상담실을 찾는 부모들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던
나에게 다롱이는 참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었다.
생후 2~3개월밖에 안 된 강아지지만 주인이 어떤 원칙을 갖고 일관성있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신기할 정도로 말을 잘 듣는 강아지도 되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말썽꾸러기도 된다는 것을 말이다. 귀하게 얻은 자식을 그저 오냐 오냐하면서, 자신의 욕구를 통제하거나 조절하는 법을 자식에게
제대로 못 가르치면 자식의 인생은 말할 것도 없고 노후에 부모의 삶도 얼마나 불행해지는 것인가를 똑똑히 보고 듣고 있기에 다롱이의 교훈이 더욱
값지게 다가오는 요즈음이다.
다시 우리 아이들의 어린 시절, 젊은 아빠로 돌아갈 수는 없는 노릇이기에 우리 아이들이 결혼해서 다시 손자
손녀를 낳아 올 때쯤이면 그 손녀 손자 녀석들의 버릇을 가르치는 데에 우리 아이들이 실패하지 않도록 다롱이가 준 교훈을 지금부터라도 꼭
전해주어야겠다.
[필자]
강학중(가정경영연구소 소장)
[출처] 월간에세이
2005년 5월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