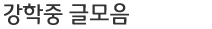|
아부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아들 녀석의 졸업식장을 찾았다. 교문 앞의 꽃파는 사람들은 여전했지만 운동장을 가득 메운 자가용 행렬은 우리 때와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다. 운동장에서의 졸업식을 생각하고 양말과 내복까지 챙겨 입고 갔지만 TV로 중계 되는 교실에서의 졸업식은 조금 실망스러웠다. 게다가
사복과 양복 차림에 퍼머로 멋을 낸 녀석들의 떠드는 소리는 30년 세월을 실감나게 했다.
여기저기 가족들과 함께 사진 찍는 아이들을 보면서 아버님이 우리 바다와 함께 환하게 웃으시며 사진을 찍는 모습을 떠올리곤 가슴이
뭉클했다.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것도 못 보시고 돌아가신 아버지, 며느리가 해 올리는 따뜻한 밥 한 공기도 못 받아보시고 저 세상으로 떠나신
아버지.... 설날, 둘째 이모님께 세배 드리러 갔다가 두 내외분의 건강하신 모습을 뵈니 또 불현듯 아버지 생각이 났다. 문득 문득 아버지
생각에 눈시울이 붉어질 때가 있는데, 내가 나이가 들어서일까?
학교도 들어가기 전 예닐곱 살 때, 아침 잠자리에서 아버지 수염을 만지작거리며 구구단을 외던 때가 기억난다. 명석, 할아버지
산소에 갔다오는 날, 버스를 기다리며 아버지가 사 주신 박하 사탕을 빨아먹던 때도 엊그제 같다. 손톱, 발톱을 깎아 주시고 줄로 부드럽게
마무리까지 해 주시던 아버진 손재주가 참 좋으셨다. 목욕탕에 가서 때를 밀어 주시던 아버지가 언젠가 는 한숨을 내쉬며 힘들어 하셨을 때, 그리고
병석에 누우셔서 마지막 폐암의 고통을 장롱 손잡이를 만지작거리며 혼자 삭히시던 그 때의 아버지를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저리다.
어머닌, 성격과 머리 벗겨지는 것까지 내가 아버지를 가장 많이 닮았다고 하신다. 우리가 말썽을 피워 속상하고 화가 나셨을 때에도
아버진 자식들을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언성을 높이시는 어머닐 이해 못하겠다며 말리시던 아버지의 감정 통제력과 분노조절 능력은 내가
물려받은 것이 아닌가 싶다.
아버진 할아버지와 시아버지 역할을 못해보고 돌아가셨다. 어머니가 올해 여든 셋이고 한국 여성의 평균 연령이 팔십을 넘겼으니 난
구십까지는 살지 않겠느냐고 아내와 농담을 나누기도 했지만 난 좋은 할아버지, 환영받는 시아버지, 존경받는 장인 노릇을 제대로 해보고 싶다.
그러나 가정과 가족이 어떻고 애비 노릇, 남편 역할을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강의하고 방송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대로, 남들에게
주장하는 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존경받는 아버지, 존경받는 남편이 되는 것부터가 쉽지가 않다. 어떤 때는 내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기도 하고
‘나만큼 잘 하는 남편 있으면 나와보라 고 해’하고 고함이라도 치고 싶은 순간도 있다.
다행히 딸 아이와 아들 녀석이 반듯하게 잘 커주어 아이들에게 늘 고맙다는 인사를 아끼지 않지만 자식들은 부모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보며 제 스스로 크는 것이 아닌가 한다. 부모가 말하는대로 크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살아가는 모습을 닮는 것이니 내가
과연 우리 시내와 바다에게 바람직한 모델인가 아닌가를 자문해보고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고 지시하는 쪽 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아이들을 수용하고
아이들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믿고 기다리는 편이다. 그리고 정말 우리 시내와 바다가 하고 싶어하는 일, 잘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주려 애쓰고
있다.
이제 막내까지 대학생이 됐으니 아내와의 시간을 좀더 가져야겠다. 지나치게 자식 중심으로 사는 것보다는 우리 두 사람 건강하고
화목하게,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요 유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녹지 않은 잔설 사이로 봄 기운이 벌써 느껴져오는 요즈음이다. 아버지가 누워 계신 산소에는 눈이 녹았을까? 아버지를 모신 운구
행렬이 장지로 떠나던 날, 외사촌 동명이 녀석이 외삼촌에게 “아부지, 작숙(고모부) 오데 가노? 이사가나?” 하고 물어보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이사가신지 너무 오래 되어서 아버질 많이 잊고 살았던 자식들을 아버진 용서하실 거라고 믿고 싶다. 그리고 저 세상에서나마 늘 건강하고
즐겁게 사셨으면 좋겠다. 아버님께 단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인사를 조용히 되뇌어 본다.
“아부지, 사랑합니더.” |